| 오늘을 '시를 읽지 않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리는 까닭, 시를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익숙함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나의 시는 나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 박송이
나의 시는 나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의 시는 나의 영혼을 가지어 본 적이 없고
나는 멀리 떠나는 자의 딱딱한 신발을 닮았고
나는 어깨를 위해 울어 본 적이 없음을 후회하고
나의 식사는 언제나 불평과 망각 사이에서 허술했고
그 빈약함으로 나의 늙은 시는 나를 쉽게 잊어버렸고
낮과 밤이 둥글어 가는 톱날 바퀴의 시작점은 얼마나 무의미한지
혀 말고 다른 언어가 있나
혓바닥 말고 다른 고집이 있나
종다리야 종아리야
나는 너의 지탱을 배우고 있나
- <나는 입버릇처럼 가게 문을 닫고 열어요>, 시인의 일요일, 2022, 17쪽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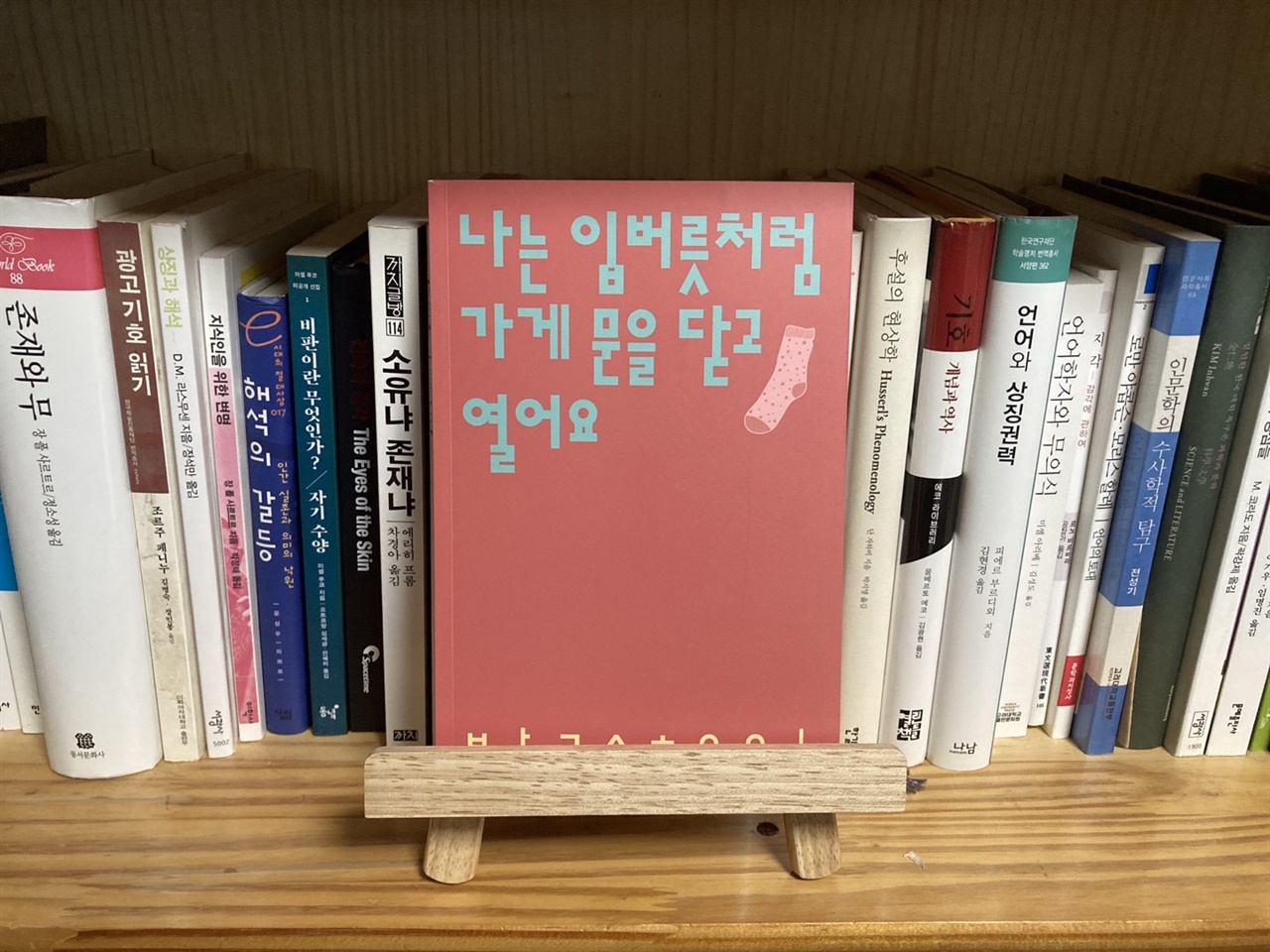
|
| ▲ 박송이 시인의 시집 '나는 입버릇처럼 가게 문을 닫고 열어요' |
| ⓒ 시인의일요일 | 관련사진보기 |
시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입 밖으로 꺼낸 '바른' 말을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행일치'를 완성할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닫아 버리면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과 비난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이라든가 또는 '비겁한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 말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주변에 이익을 탐하는 아첨꾼들이 가득하다면, 비판이 찬양이 되어 그의 귀에 들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지한 자들'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발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시인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박준 시인이 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 쓰는 박준입니다'라고요. 저도 '시 쓰는 주영헌 드림'이라고 끝말을 맸습니다. '시 쓰는~'라고 말하는 까닭은 자신을 시인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시인인 순간은 '오직 시를 읽고 쓸 때'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제는 시 낭독회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인이 시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이라고요. 상징성으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시라는 세계 속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 제정신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와 삶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란 시인이라는 한 인간이 써내는 문학 장르입니다. 이 문장에서 '한 인간'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출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한 인간이 얘기하고 싶은 바를 언어로 써내는 문학입니다. 해설에서 김주원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는 언어의 예술인 동시에 삶의 예술이다. ... 그의 시는 성장의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기민했고 삶의 밑바탕을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110쪽)'라고요.
롤랑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에서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필사자'로 바꾸고 '독자'의 탄생을 언명(言明)했습니다. 바르트의 선언은 긍정하지만, 완전한 저자의 죽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큰 강도 발원지가 있듯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첫 의도와는 달리 다수의 독자에게 읽히고 재해석·재구조화 된다고 해도 '근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학 작품은 한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가 쓰여 발표되는 순간 이 시는 더 이상 내 시가 아니다'라는 말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문장, 앞에서 했던 말과는 상반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른 얘기도 아닙니다. 이 문장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바는 강의 '발원지'가 아니라 흐르고 흘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 그 자체입니다. 내가 쓴 시는 '발원지'에 불과하지만, 독자가 있어 내(川)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를 쓰다 보면 시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다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이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의심이 사라진 나는 시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인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 '질문하는 자'입니다. 시인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속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의심의 공명'을 참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 쓰는 주영헌 드림
박송이 시인은...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시)로 등단했다. 시집 『조용한 심장』과 동시집 『낙엽 뽀뽀』가 있다. 대산창작기금과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시와 산문은 오마이뉴스 연재 후, 네이버 블로그 <시를 읽는 아침>(blog.naver.com/yhjoo1)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