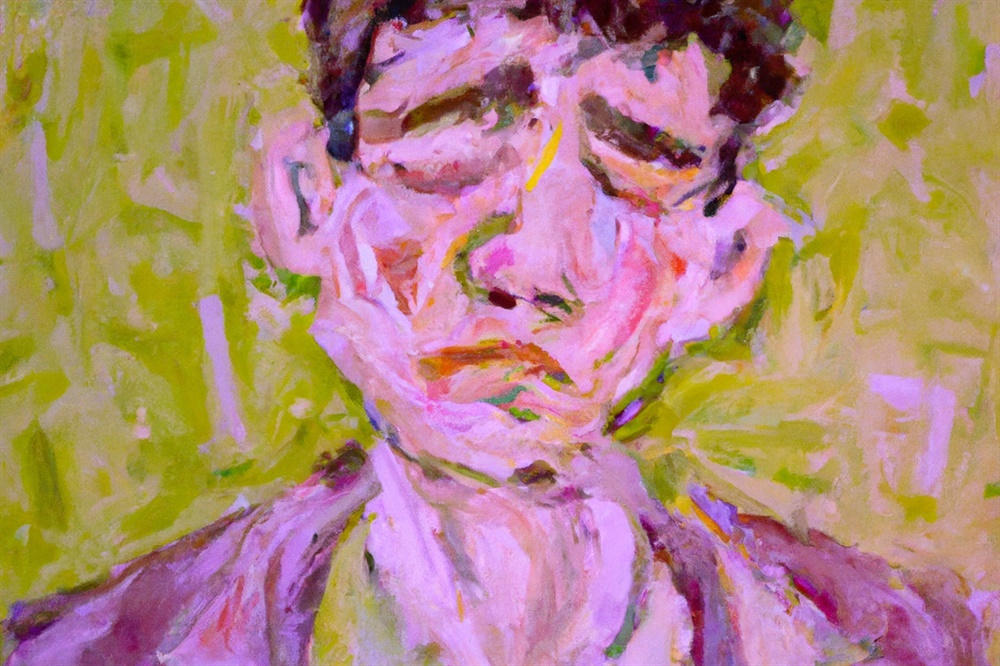
▲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인공지능형 이미지 생성 모델인 달리(DALL·E)로 구현한 이미지 ⓒ DALL·E
가끔 잠을 자다 새벽에 눈을 뜨곤 한다. 그럴 때는 수면용 안대를 쓰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게 상책이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하다간 수면의 흐름이 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안다고 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낸 무수한 밤들이 왜 있었겠는가. 특히 휴대폰의 알림은 너무도 큰 유혹이다. 잠든 사이에 도착한 메일과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새 게시물을 알려주는 알림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집었다.
부고를 접한 건 그때였다. 반가운 얼굴이 화면에 보였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유명인의 사망 소식을 주변에 잘 공유하지 않는다. 어차피 알게 될 것을 왜 그러나, 이해를 못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게 이해가 됐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을 어디라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젊은 가수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 나는 그 사람의 엄청난 팬은 아니지만 신곡이 나오면 챙겨 들었고 화제가 된 무대는 모두 찾아보았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지켜보았다. 밝고 반듯한 이미지의 사람이었다. 연예인이라면 생길 수도 있는 사소한 구설도 없었다. 무대에서건 예능 프로그램에서건 늘 명랑한 에너지를 주변에 전했다.
다른 이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수의 팬들만이 아니라 대중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 물론 사람의 목숨에 경중이란 없기에 어떤 상실도 안타깝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등졌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세상이 주는 것도 없이 어떻게 빼앗아 가기만 하는지 망연자실한 감정이 든다.
특히 더 무겁게 다가오는 연예인의 죽음
앞서 말했듯 안타깝지 않은 상실이란 없다. 하지만 대중문화 예술인 그중에서도 연예인들의 죽음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무게가 만만치 않게 다르다. 그들은 엔터테이너,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 물론 어떤 연예인들은 강력한 후광과 카리스마로 쉽게 범접하기는커녕 거리감조차 좁힐 수 없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
하지만 친밀감과 편안함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거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중과 호흡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특히 케이팝 산업에서 아이돌들은 그런 역할을 자주 맡는다. 때문에 대중이 어떤 연예인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실감의 크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물며 가수와 더욱 감정적으로 밀착했던 팬들은 어떨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고인을 실제로 알았건 몰랐건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건 결코 유난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이 '내 마음이 유난일까' 의심하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상처만 곪는 상황이다(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이번의 상실로 괴로워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감정을 존중해 주자).
대중문화인의 죽음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또 다른 짐을 남기기도 한다. 바로 죄책감이다. 언급했듯 연예인들은 팬과 대중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심지어는 세상에서 버틸 이유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나는 행복했는데, 당신은 아니었구나. 내가 받은 기쁨과 사랑, 행복 뒤에서 당신은 어떠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엇을 받은 걸까.
추모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이유
물론 알고 있다. 그 죄책감이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고인이 남긴 유산을 허무는 감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수인 그 사람이 대중에게 기쁨을 전하던 그 시간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유했던 순간들이 결국 무엇이 되겠는가. 무대에서 방송에서 우리로 묶이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 호흡했던 추억들은 결국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삶의 모든 고난처럼 추모에도 같은 딜레마가 있다. 답을 알고 있는데 잘 실행하지 못한다. 쉽지 않다. 남겨진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고인을 더욱 사랑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방황하게 된다. 당신은 왜 안녕할 수 없었느냐는 후회가 가득한 한탄을 마음에 품은 채.
추모의 글을 자주 적어왔다. 고인이 남긴 유산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짚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글들. 때로 그런 글들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두 경우 모두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냐면 추모의 글이 가지는 공통적인 흐름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며 나는 사람을 보낸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 글은 써지지 않는다. 보내기가 싫기 때문이다. 상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모와 애도 없이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고인을 놓지 못한다. 알고 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 그래선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마음이 생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고인을 적어도 지금 이곳에서는 정말로 보내게 되니까.
우리에게 준 행복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떠났기를
글의 마지막에 와서 이야기하기는 미안하지만, 사실 이 글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할 것이고 명확한 메시지도 없을 것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며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어지는 부고 속에서 이제는 지친 것인지 아니면 고인이 생각보다 내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며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시기를 예상할 수 없을 뿐 누군가는 결국 떠난다. 이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의 흐름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곱씹으며 상실을 겸허히 수용하자고 늘 다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때로는 실패한다. 아마 나와 같은 이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 망연자실한 그 마음을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늘 생각대로 되진 않는다.
글을 쓰는 내내 고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않았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을 적는 순간 상실은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딜레마는 다시 발생한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모는 시작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고 멋있었고 고운 이였는지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 그 사람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남기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름을 부르고 떠나보내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잠시 숨을 고르고 해야만 하는 그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안녕 문빈. 당신에게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행복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으로 떠났기를. 가수 해줘서 고마웠어요.

▲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