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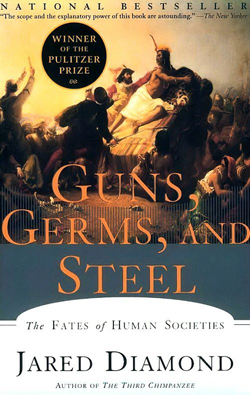 | | | | | | ⓒ W.W Norton | 황하, 인더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문명의 발상지는 왜 한결같이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 모여 있을까요?
<총.균.쇠>의 저자 자레드 다이아몬드는 농사기술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생활을 졸업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농사기술의 발견이었지요. 지금 우리가 IT기술에 열광하듯 농사기술은 당시의 인류에게는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나무에서 따먹는 대신에 키워서 먹다니...
농사는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위도와 기후대에서 수만Km에 이르는 땅이 끝 없이 펼쳐진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 농사기술이 전파되었고 문명 역시 이런 경로를 따라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가설입니다.
지구의 경도선을 따라 수직으로 뻗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대신에 유라시아에서 고대문명이 발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레드 다이아몬드의 역사관은 어느 독자의 표현처럼 우주에서 바라본 세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테크놀러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신없이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에 새삼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사는 기술발전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원시문명을 나눌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하듯 말이죠.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역사시대로 접어들면 학자들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을 일단 접어두고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치우치기 시작하죠. 서지학에서 인류의 정신적 발전과정을 추적해볼 수 있다면 기술사에 주목을 하면 거시적 역사발전의 과정을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격해졌지만 정작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교는 성경의 해석을 사제에게 맞기지 않고 평신도들이 직접 경전을 읽고 공부하게 하는 데서 구교와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신도들에게 읽힐 대량의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과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술 개발이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요?
마샬 맥루한은 그의 명저 <미디어의 이해>에서 활자뿐 아니라 인류의 언어와 문자 자체를 미디어의 일종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기호학자 움베르트 에코는 카톨릭을 매킨토시에, 프로테스탄트를 PC의 DOS 운영체제에 비유하기도 했지요.
지금도 카톨릭의 미사는 장엄한 성당에서 일종의 상징적 '아이콘'을 전하는데 그치는 반면 신교의 교회당에서는 신도들이 활발하게 성경의 '활자'를 읽고 공부를 합니다.
매킨토시 컴퓨터의 아이콘과 장엄한 장식으로 가득한 카톨릭 성당.
PC의 DOS 운영체제와 성경공부 목소리로 시끄러운 신교의 교회당.
사실 아이콘(Icon)의 원래 뜻은 성상(聖像)입니다. 활자가 보급되기 이전에 유럽의 도시마다 들어선 성당은 지금의 TV처럼 당시에 일종의 대중매체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구교와 신교의 대립에도 활자매체라는 혁신적 테크놀러지의 개입이 수반되었군요.
아시아의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지금 테크놀러지는 우리 정치, 사회에 어떤 변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사회 곳곳에 혁신적 테크놀러지가 새겨 놓은 흔적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심지어 계급과 세대간에도 넘기 어려운 골이 파이고 있군요.
언젠가 저의 글 '신토불이 신책불이(身土不二, 身冊不二)' 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세대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문 같은 활자매체에 길들여진 구세대와 인터넷에 익숙해진 신세대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2년 대선을 신문이, 97년 대선을 TV매체가 결정했다면, 2002년 대선의 향배는 인터넷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구 테크놀러지의 자리바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지만 다만 아무 탈없이 부드럽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비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깐느에서
덧붙이는 글 | *민경진 기자는 <테크노 폴리틱스>(시와사회-2000)의 저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