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잘 그린 그림, 오래되고 국보라서 엄청 비싼 그림일 거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그림에 이렇게 깊고 감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줄은 지금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한도>는 국보 제180호로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던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 준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동그란 문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고, 그 집 옆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위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의 화제 '세한도歲寒圖'가 써져있고, 그 옆으로 '우선(이상적의 호)은 감상하시게, 완당(김정호의 호)'이라는 뜻의 '우선시상 완당藕船是賞 阮堂'이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되새기며 되짚어 볼 수 있는 의미 담아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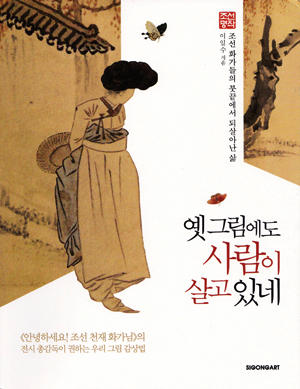
|
| ▲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지은이 이일수/(주)시공사/2014. 4. 30/1만 7000원) |
| ⓒ 임윤수 |
관련사진보기 |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지은이 이일수/(주)시공사)에서는 <세한도>는 물론 널리 알려진 우리 옛 그림에 담긴 뜻과 의미를 되새김질을 하듯이 되짚으며 감동적으로 새길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명예, 부와 출세를 좇는 인간들 속성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죽는 시늉까지 해가며 따르지만 별반 이익이 되지 않거나 별거라고 생각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 몰라라 하며 등을 돌리는 게 통상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일지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출석을 부르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아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끔뻑하지만 막상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면 지나간 인연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사제지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사의 제자 이상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끈 떨어진 스승일지라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당시로서는 중국에서조차 구하기 힘든 책들, 아주 귀한 책들 중 평소 추사가 보고 싶어 했던 책들을 연달아 보내줍니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뇌물로도 사용 할 수 있을 만큼 위한 책들이지만 이상적은 스승만을 챙겼습니다. 유배 중인 중죄인에게 책을 보내다가는 자칫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이상적은 그까짓 위험쯤 기꺼이 감수합니다.
세한도는 그런 제자, 스승을 감동시킬 만큼 진심으로 스승을 섬기고 있는 제자 이상적에게 추사가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그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제자의 마음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낸 추사의 마음이자 울림이라 생각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수시로 연락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모른 척하는 지인을 보는 것도, 반대로 내가 매우 힐들 때 걱정하는 적하며 나의 아픈 상처를 자꾸만 들추는 지인을 보는 것도 씁쓸하다. 나 또한 내 이익의 가능성에 맞추어, 조건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된다. 사람 관계가 더 삭막해지는 요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가 제자에게 그려 보낸 <세한도歲寒圖>를 통해 진정한 사제 관계를 묻고자 한다.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97쪽-책에서는 익이 널리 알려진 우리 옛 그림들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신윤복의 <기다림>, 이암의 <모견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김홍도의 <행상>과 <자리 짜기>, 김정희의 <세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김희겸의 <석천한유도>, 윤두서의 <진단타려도>, 최북의 <금강산 표훈사도>, 이인상의 <검선도>, 진재해의 <영잉군 초상>, 채용신, 조석진의 <영조어진>, 어몽룡의 <월매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3전시실에서는 신사임당의 <노연도>, 윤덕화의 <책 읽는 여인>, 남계우의 <화첩쌍폭도>, 김홍도의 <죽리탄금도>, 장한종의 <책가도>, 신윤복의 <연당의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야익숙한 이름이 붙은 그림들이라서 어디서 한 번 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림들이 많을 겁니다.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문양만 본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잔칫상을 그린 그림이 제아무리 그럴싸하게 그려졌다 해도 잔칫상에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상하면 잔칫상그림은 보고 있으되 그 그림에서 맛난 맛까지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알고 있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정성과 수고로움 까지는 물론 그 음식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까지를 알고 본다면 같은 잔칫상 그림을 보고 있을지라도 그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감흥은 천양지차일거라 생각됩니다.
영모화翎毛畵(새와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와 초충도草蟲圖(풀과 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는 부귀와 장수 같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개와 나무를 함께 그리는 이유는 개를 나타내는 '개 술戌'자와 '지킬 수戍'자의 한자 모양이 비슷하고, 지킬 수戍'자와 '나무 수樹'자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모견도>에도 도둑에게서 집을 지켜 주고 세상의 모든 나쁜 것에서 가족을 지켜 주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38쪽-흔히들 신사임당이 풀벌레를 그린 이유에 대해, 조선의 여자들은 외출이 쉽지 않았기에 주변에서 소재를 택했다든가, 여자의 감성적인 시선에서 고른 소재가 꽃과 나비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은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간과한 면도 있다. 신사임당의 텃밭 나들이와 풀벌레 그림은 '보이는 것(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본질)을 보려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262쪽- 음식을 할 때 이유 없이 넣는 양념은 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는 처리도 없습니다. 맛을 내거나 더하기 위해서 할 뿐입니다. 그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그리는 문양 없고, 까닭 없이 긋는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자 하는 걸 더 담고, 담고자 하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이지만 어쩜 대개의 우리는 그것들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기고 되짚다 보면 점점 깊은 멋 우러나는 우리 옛 그림이빨 없어 우물우물 씹어 삼키는 고기는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맛도 잘 모릅니다. 혹시 그동안 이빨 없이 대충 우물거리며 씹던 고기를 꿀꺽 삼키듯이 우리 옛 그림 또한 그렇게 봐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육즙처럼 배어있는 의미, 맛처럼 우러날 멋스러움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채 훌훌 봐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지은이 이일수/(주)시공사)는 고기를 제대로 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빨처럼, 우리 옛 그림을 제대로 음미해 볼 수 있는 치아 역할을 해 줄 겁니다.
그림을 보는 눈이 침침한 사람에겐 밑그림으로 감춰진 실선까지도 또렷하게 보여줄 돋보기 같은 내용이고, 그림에 담긴 사연을 궁금해 하는 사람에겐 이런 사연과 저런 의미를 귀엣말처럼 들려줄 사연보따리 같은 내용이기에 읽다보면 어느새 두 눈은 똥그래지고 두 귀는 쫑긋 세우며 읽게 될 거라 기대됩니다.
덧붙이는 글 |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지은이 이일수/(주)시공사/2014. 4. 30/1만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