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이들 교육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조선일보>는 비교과 활동 성적도 부모의 능력순이라는 기사를, <한겨레>는 학생부 전형은 학생 배경 전형이라는 기사를,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과 교내 활동은 부모의 도움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진다'는 게 기사의 요지인데요. 2시간 대학 입시 컨설팅에 20만 원, 비교과 입시 컨설팅에 월 200만 원이나 하는데, 그조차도 가정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이나 넘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대학 입시는 학교의 공교육에 따른 아이의 성취도가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흙수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금수저·은수저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똑똑해도 그 차이를 뛰어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 아이만 처지는 거 아냐?'라는 불안감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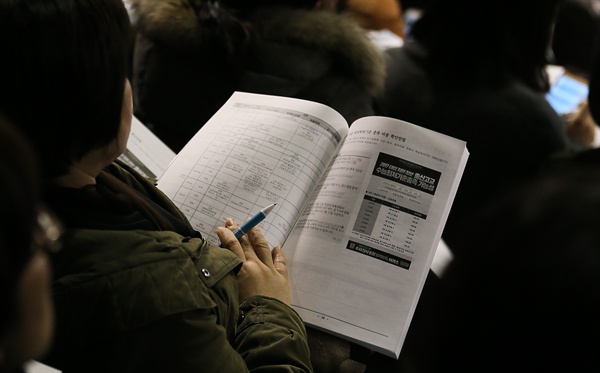
|
|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대폭 바뀐 수능에 따른 대학입시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입학을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게 만연한 사회입니다. 내 아이가 그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사교육 시장은 그런 불안 심리를 야금야금 잠식하며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죠. 입시 정책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방식의 교수법이나 컨설팅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액 입시학원(한 달에 50만 원가량)에 보내달라고 했다가 "너만 자식이 아니라 네 아래 동생도 둘이나 있다"라며 안 된다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끝까지 학원을 보내달라고 우기지 못한 건 학원을 다닌다 해도 스스로 공부에 몰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또 당시 그 학원에 다니고 싶어했던 이유가 성적 향상에 있던 게 아니고 공부 좀 한다는 선배나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였기도 했고요. 가정 환경이 좀 넉넉한 친구들의 학원·과외 등을 지켜보며 상대적인 결핍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범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인데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을 '수저'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불편하지만 요새 회자되는 수저 계급론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누구는 이렇게 산대'... 지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우울함
큰사진보기

|
| ▲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우리는 흙수저가 아냐'라고 자위해봐도, 그래봐야 '스테인리스 수저' 정도가 아닐까. |
| ⓒ wiki commons |
관련사진보기 |
'지금 우리는 대출 없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걸 사줄 수 있는 형편은 되잖아?'라면서 스스로를 흙수저가 아니라고 위안 삼아보지만 그래 봐야 은수저도 아닌, 스테인리스 스품 쯤 되려나요?
아이들의 사교육으로 월급을 쏟아붓자니 부부의 노후는 커녕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조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아버지의 심장 질환이나 친정엄마의 암 투병이 그렇지요. 입주나 종일 시터로 아이들 보육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시간제 돌봄 시터와 친정에 빌붙어 일주일, 한 달을 버티고 있죠.
학창시절 친구나 선후배의 잘 살고 있는 근황을 듣거나, 지인의 사회적 성공을 알게 되거나, 수저론 운운하며 불평등한 자녀 교육 시장에 대한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면 우울함에 빠집니다.
저희 부부는 출산이 늦어 이제 막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은 친구들 중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도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한 달에 200만~3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남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친구의 이야기,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더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 참 우울해집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사교육을 감당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인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시장 금리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저희 부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친구 부부가 'FM 대출'(Father & Mother 대출, 아빠엄마 대출)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대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졌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양가에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맞벌이라 넉넉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부부가 감당해야 할 저마다의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해 들은, 혹은 온라인이나 신문에 떠도는 그네들의 삶 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 격차를 체감할 때 생기는 우울함.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좁혀지지 않는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느끼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비정상은 아니겠죠. 내 삶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며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내일이면 혹은 다음 주에는 이 우울함을 툭툭 털고 일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엄마는 제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보내주지 못 해 무척 오랜 기간 마음을 쓰셨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입시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에서도 자식에 대한 이런 부모의 마음을 공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갑이 열리는 거겠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버 개인블로그(http://blog.naver.com/nyyii)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